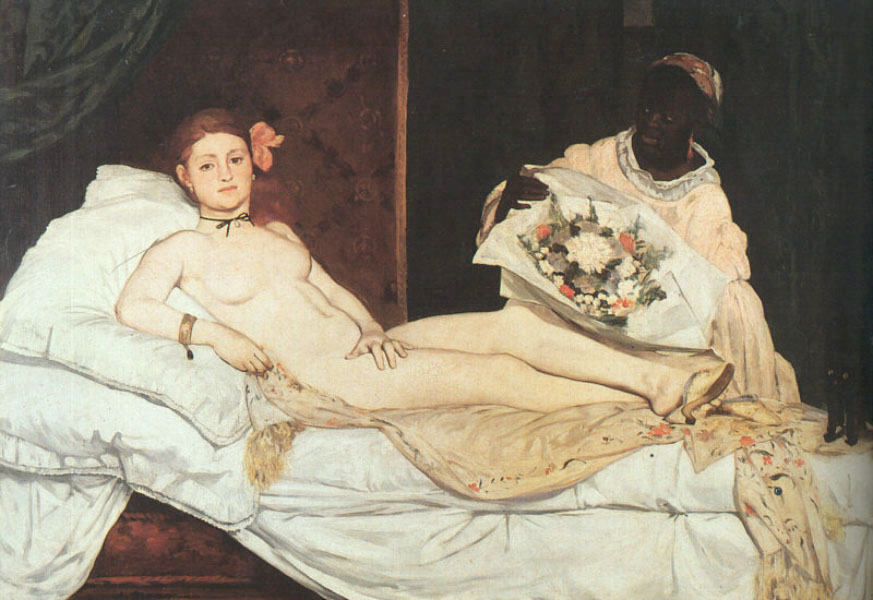이재훈
웃음이 사방에 번지는 날.
선생님께서 묶어놓은 밧줄을 풀고
거리를 나섰다.
몸에 핀 동그란 열꽃이
펑펑 터져 붉고, 푸르고, 검은 파문이
살갗에 차올랐다.
얼굴 없는 안개의 밤,
죽음의 그림자를 막연하게 살피던 밤,
한밤 내 웃었다.
접힌 주름 사이로 웃음의 까닭을 세어보는데
온몸이 얽어 있었다.
밤새 축축하고 끈적해진 공기가
얽은 피부를 핥고 있었다.
숯덩이처럼 뜨거운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다.
보석을 입안 가득 물고 있었다.
몇 백 년이 흘렀을까.
놀라운 비약이 있었고,
시대는 공상을 허락하지 않았다.
나는 학교를 졸업하고
행복과는 먼 밤들을 채워나갔다.
간혹 알몸으로 욕조에 들어가
낯선 배꼽을 만졌다.
움푹, 깊숙한 골이 생겼다.
웃음의 까닭도 모르고
자꾸 웃고만 있었다.
_ <작가와사회>, 2008년 봄호